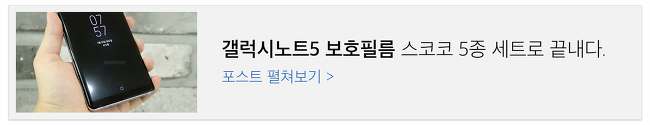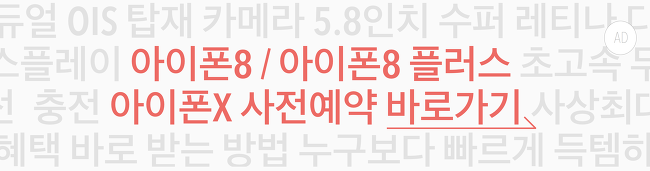아직까지도 이름이 가진 의미나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제품을 만져보면 손이 작은 사람이나 여성분들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그 매력에 빠진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할 것 같다.
특유의 유선형 디자인에 더해서 플랫한 화면이 만나면서 얻게 되는 장점은 생각보다 많았는데, 우선 화면을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여줄 뿐 아니라 동시에 그립감을 높여서 한 손으로 잡는 맛이 좋아진다는 것이 있다.

그러나 V30의 매력은 그뿐만이 아니다. 카메라 부분을 보게 되면 V30의 진가가 드러나는데, 역대 듀얼 렌즈를 탑재한 카메라 디자인 가운데 가장 심플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간결할 뿐 아니라 그러면서도 고급스러움을 놓치지 않아서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B&O 로고는 고급스러움을 더해줬고, 특별한 필름으로 완성된 후면과 측면의 라인은 그 자체로 고급스러움을 어필하기에 충분한 요소가 되어줬다. 그렇다면, V30의 내부는 어떠했을까? V30 라벤더 바이올렛의 출시보다 더 빨리 만나본 라벤더 바이올렛 컬러를 통해서 V30의 UX를 살펴볼 예정이다.

V30는 이전까지 V20와 V10이 유지하던 세컨드 디스플레이를 완벽히 씻어냈다. 그러면서 화면의 비율을 키웠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 하나를 잃고 10가지는 얻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엘지가 놓친 부분이라면 세컨드 디스플레이의 ‘고정된’ 경험을 그대로 계승하지 못했다는 것이 있다.
V 시리즈의 아이덴티티 가운데 하나였던 세컨드 디스플레이는 언제나 그 자리에서 정보를 띄워주고 원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이었다면, 엘지가 V30에서 선보인 플로팅 바는 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면 쏙 들어가 버리거나 그 기능 또한 한정적인 경우가 많아서 V 시리즈의 아이덴티티를 100% 살려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당연하게도, 기존 V 시리즈에서도 100% 퍼포먼스를 발휘하기 힘들었던 세컨드 디스플레이의 다양한 경험들은 플로팅 바로 넘어오면서 마이너스가 되었기 때문에 더욱 자주 사용하지 않는 기능이 되고 말았다.
어떠한 기능이 사용자 경험의 한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자주 노출되고, 필수적인 기능이 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다.

플로팅 바는 개인 설정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그 영역이 한정적이고, 앱을 실행할 경우 다시 숨어버리는가 하면, 다시 꺼내서 원하는 위치로 이동할 경우에도 위치가 한정적이며 최상단이나 최하단에 고정하는 기능 또한 제공하지 않았다.
장점이라고 한다면 물론 특별한 진동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진동의 느낌이 전체적으로 볼 때 아이폰의 그것과 비슷해서 상당히 수준 높은, 즉 완성도 높은 느낌이라는 것이 있었다. 하지만, 사용성이나 활용도 측면에서 보자면 마이너스가 많았다.

엘지가 선보인 V30의 최대 셀링 포인트는 18:9 비율의 OLED 풀비전 디스플레이라 부를 수 있다. 즉, 화면을 더 넓게 사용하는 것이 최대 장점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홈 터치 버튼은 과연 100% 퍼포먼스를 보여줬을까?
우선, 장점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V30의 홈 터치 버튼은 숨겨둘 수도 있고 위치를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 그것도 단순히 좌우의 순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기능을 넣어서 재조립을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멀티태스킹이나 홈 버튼, 뒤로 가기는 빼놓을 수 없지만 원한다면 알림창, 캡처+, Q 슬라이드 가운데 원하는 기능을 ‘하나’만 더할 수 있다.
즉, 최대 4개까지 넣을 수 있는 것인데 여기서 아쉬움이 나오게 된다. 바로, 4개 배열로 인해서 홈 버튼이 중앙에 위치하지 않는 것이다.

사소해 보일지 몰라도, 경험에 있어서 홈 버튼이 고정적으로 중간에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홈 버튼의 위치를 사용자의 의도대로 원하는 곳에 넣을 수 있는 것과, 중간에 위치할 수 없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동 숨김을 할 경우 아래에서 위로 슬라이드를 하면 다시금 홈 터치 버튼이 나타나게 되는데, 문제는 뒤로 가기를 거듭해서 할 경우에 자꾸만 홈 터치 버튼이 숨어버린다는 것이 있다.

즉, 웹서핑을 하다가 뒤로 가기를 누를 경우 2~3번은 누를 수 있을지 몰라도 이후에는 홈 터치 버튼이 자동으로 숨어서 다시 꺼내야만 한다. 경험이 이어지지 않는 것이다. 사용자가 홈 터치 버튼을 사용할 경우 다시금 시간 카운트를 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결과다.
결과적으로 보자면 화면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홈 터치 버튼 숨기기는 장점이라 부를 수 있었지만 세세하게 사용자의 경험을 다듬었는지에 대해서는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V10, V20와 비교해서 V30가 가장 달라진 점 가운데 하나라면 단연 올웨이즈 온 디스플레이의 영역이 무한히 넓어졌다는 것이 있다. 즉, 원한다면 최상단이나 중간, 최하단 어디든 배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제는 더 이상 어두운 곳에서 V30의 올웨이즈 온 디스플레이가 뿌옇게 전체적으로 빛을 발하지 않으면서 원하는 곳에만 더욱 밝게 빛을 내는 것이 가능해졌다.

당연하겠지만, 이러한 변화는 선택지가 더 많아지는 것으로 이어지게 된다. 더욱 많은 시계 디자인과 달력, 기타 서명이나 사진 등을 넣어둘 수 있다는 것이다.
어쩌면 세컨드 디스플레이에 갇혀 있던 작은 올웨이즈 온 디스플레이가 더욱 다채로운 변화가 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는 기대되는 기능상의 차이였다.

그러나 2%의 아쉬움이라면 V30의 올웨이즈 온 디스플레이는 컬러 선택지도, 더욱 많은 디자인도, 자유도도 주어지지 않으면서 그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패턴과 디자인, 하나의 단일 컬러만 가지고 설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있다.
V30의 얼굴이 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면서 아쉬움으로 남은 부분이다.

다음으로는 한 손으로 조작하기에 편리한 미니뷰 기능이 있다.
엘지는 지난번 모델에서 미니뷰를 제공하지 않아서 아쉬움을 남겼는데, 이번 모델에서는 다시금 미니뷰를 선보이면서 나름 장점을 계승하고 있었다.

미니뷰를 활성화할 경우 홈 터치 버튼을 좌/우로 슬라이드 해서 작게 만들 수 있는데, 단순히 작게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치나 크기까지 자유롭게 설정이 가능해서 자유도가 상당히 높았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V30의 미니뷰는 한 손으로 타이핑을 하는 경우나 두 손 조작이 힘든 경우, 혹은 손이 작은 경우 모두 매우 유용한 기능이 되면서 그 자체로 큰 장점이라 부를 수 있었다.

2%의 아쉬움이라면 모서리 부분으로 가져갈 경우 끝까지 이동이 되지 않아서 모서리가 다소 어색하게 잘려 보인다는 것이 있고, 전체적인 디자인이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조금 더 세련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V30의 미니뷰는 다른 폰보다 더 많은 자유도를 주면서 충분히 만족스럽다는 평가가 가능했다.
✎ 고급스러움을 마음껏 어필했던 V30 라벤더 바이올렛 색상
✎ 원하는 곳에만 더욱 밝게 빛을 내는 것이 가능해졌던 올웨이즈 온 디스플레이
✎ 더 많은 자유도를 주면서도 충분한 만족감을 주었던 미니뷰
✎ 원하는 기능을 넣어서 재조립을 할 수 있어서 편리했던 홈 터치 버튼
✎ 실용성과 편의성을 높인 V30 라벤더 바이올렛의 UX
오늘은 V30의 사운드에 대해서 날카롭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무조건 좋다거나 나쁘다는 것이 아닌, 소비자로서 어떠한 점이 기대 이상이었고 기대 이하였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오늘 상세히 다루지 않은 V30의 다른 많은 부면들은 충분히 다듬어지면서 장점이 되고 있다. 실제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드럽고 매끈하게 이어지는 UX는 경험의 완성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만족도를 높여주는 상황이다.

이를테면, 하이파이 오디오 설정이나 전화, 문자 UI 및 위젯을 더하거나 상단 바를 내렸을 때의 디테일들이 잘 다듬어지고 사용자 중심적이 되면서 편리하다는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
하지만 반대로 꼭 V30이어야만 가능한 UI나 UX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과 단계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사용자의 의도와 다르게 움직인다거나 혹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보여줘서 아쉬움을 보여준 부분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V30의 UX는 85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작고 가벼운 무게, 대화면으로 경험하는 다양한 기술들에 더한 V30의 UX는 그 자체로 기대 이상의 만족도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엘지가 소비자들의 의견을 더 많이 받아서 아쉬움만 보완한다면 더욱 만족도 높은 V30가 되지 않을까 싶었다. - MACGUY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