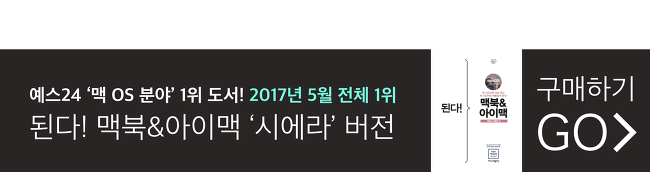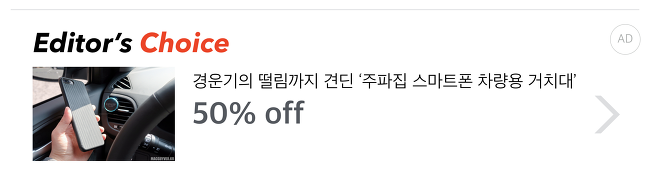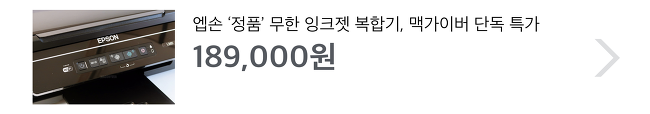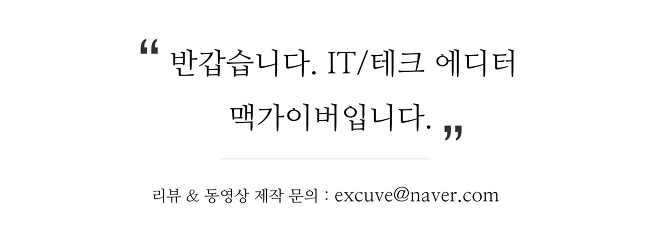
이름도 나쁘지 않았다. G6.

사실 G5를 발음하는 ‘지파이브’ 보다는 ‘지씩스’가 무언가 더 있어 보였으니까. 하지만 엘지의 네이밍 전략은 아이러니한 ‘옆그레이드’ 전략과 만나게 되면서 소비자들은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다.
G6가 출시된 이후 파생 모델이 등장할 예정이며, 이름은 ‘G6 프로’라고 알려졌다. 그렇다면 무엇이 기대가 될까? 당연히 G6 보다 더 ‘프로’ 다운 모습을 갖추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모른다.
하지만 엘지는 완전히 다른 선택을 했다.
그리고 또 다른 제품도 있다. ‘G6 플러스’라 불리는 모델인데, 이 2가지 파생 모델은 뒤늦은 출시라는 아쉬움은 뒤로 하고서라도 네이밍 전략에 대한 엘지의 접근 방식이 다소 어긋나 있음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말았다.
엘지는 G6를 내놓으면서 ‘기본기’를 내세웠다. 그만큼 기본기가 탄탄한 제품이라는 것인데, 문제는 하나로 통합하려다 보니 제품의 용량은 해외에서는 32기가로, 한국에서는 64기가로 단일 모델만 출시가 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선택지가 하나뿐인 G6는 아킬레스건을 지닐 수밖에 없었고, 뒤늦게 32기가 모델과 128기가 모델의 국내 출시 소식을 알려왔다.
하지만 이 제품들의 이름은 아이러니하게도 G6 프로와 G6 플러스다. 그러니까, 프로보다 플러스가 더 상위 모델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 이름이 그대로 출시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G6 프로와 G6 플러스로 불리는 것이 확정적인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의아할 수밖에 없다.

왜 용량이 더 작은 모델이 ‘프로’라고 불리는지, 그리고 왜 무선 충전까지 더하면서 용량을 128기가로 키운 프리미엄 모델을 ‘플러스’라 정했는지에 대해 명확한 해석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 역시 ‘엘지의 마케팅을 이해하려 하지 말라’는 것일 정도로 난해하다는 평가가 많다.
이보다 먼저 출시된 V 시리즈의 네이밍을 살펴보게 되면 더욱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G 시리즈와 달리 V 시리즈는 2자릿수로 네이밍이 정해졌는데, 처음에는 나름의 이유가 명확했다.
V10이라는 이름으로 10가지 매력을 전달하겠다는 것이다.
V1 보다는 V10이 조금 더 좋아 보이기도 했고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았다. 그러나 이후 V11이 될지 V20이 될지 궁금해하던 소비자들에게 엘지는 V20를 들고 돌아왔고 소비자들은 그렇다면 V20는 20가지 매력과 가치가 있는지 물음표를 던졌지만 엘지는 네이밍 선정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향후 출시될 제품은 당연히 V30가 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엘지는 또 어떠한 네이밍 책정의 이유를 언급할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중저가폰 역시 네이밍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당장 중저가폰의 수요가 많은 부모님 세대에게 이야기를 해보자 ‘갤럭시A나 갤럭시J로 드릴까요?’ 아니면 ‘X300이나 X400, 최근에 출시된 X500으로 드릴까요?’라고 물어본다면, X400이라고 명확히 꼭집어서 대답할 부모님은 많지 않을지 모른다.
더구나 X300이나 X400은 어떠한 기능적인 차이로 이름이 정해진 것인지, 또한 X는 무엇을 뜻하는지도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어떠한 점도 발견할 수 없었다.
최근에 출시된 X500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2년, 3년이 지나면 향후 모델은 X301이 되는 건지 아니면 X300 2019 에디션이 되는건지도 향방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결국 엘지의 네이밍 전략은 ‘아이폰’처럼 어떠한 아이콘이 된 것도 아니고 ‘갤럭시 = 삼성’처럼 특정한 이미지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도 아닌, 그저 엘지만의 방식으로 네이밍이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엘지의 스마트폰 네이밍을 보자면 G 시리즈는 1자릿수로, V 시리즈는 2자릿수로, X 시리즈는 3자릿수로 되어 있다.
그러나 굳이 이렇게 숫자를 늘려가며 외우기 힘들게 만드는 것이 좋은 전략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다.

삼성의 경우는 갤럭시S, 갤럭시A, 갤럭시J 등 명확한 ‘갤럭시’라는 이름에 ‘알파벳’ 하나만을 더해서 제품군을 구분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갤럭시’ 혹은 ‘갤럭시A’ 등으로 확실하게 인지가 가능하도록 네이밍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애플 역시 ‘아이폰’을 중심으로 ‘아이폰6’ ‘아이폰6s’ ‘아이폰7’ 등으로 나름의 규칙성을 가지며, ‘아이폰 SE’ 등의 경우도 여전히 ‘아이폰’을 필두로 소비자들에게 쉽게 각인되도록 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엘지의 네이밍 전략은 G6 보다 못한 G6 프로의 출시라거나, G6 프로보다 더 강력한 G6 플러스의 출시 등으로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오히려 더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처음부터 로드맵을 제대로 짜고서 G6를 3가지 용량의 모델로 출시하거나, G6 플러스 혹은 G6 프로 가운데 하나만 정해서 무선 충전이 되는 모델로 내놓았다면 소비자들은 G6를 보다 더 쉽게 이해하고 접근했을지 모른다.
이름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기업에 따라서는 이름 하나만을 위해서도 1년 이상의 시간과 공을 들이고 있다. 그러나 엘지의 네이밍 전략이 정말 제품 판매와 이미지 형성에 있어서 긍정적인지는 엘지 스스로가 돌아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 MACGUY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