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랍을 열다. 모듈을 만나다.
사실, 나는 매일매일 G5 캠플러스 모듈을 만난다. 지갑과 차 키가 들어 있는 서랍 한켠에 고이 모셔둔 G5 캠플러스 모듈이 힐끔 얼굴을 내밀고 있기 때문. 그러나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손이 가지 않는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했다.
서랍을 열고는 모듈을 보기는 했는데, 도통 손이 가지를 않으니 사용할 일도 없고, 무엇보다 G5 캠플러스 모듈을 교체하는 과정을 생각하자니 도무지 손이 가지 않는 것도 당연해 보이기도 했다.
G5 캠플러스 모듈은 카메라 성능의 향상은 1도 없고, 그저 편의성만 제공해준다고 하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G5 캠플러스의 편의성 역시 의문이 들기도 했기 때문. 결과적으로 G5 캠플러스 모듈은 오늘도 내일도 매일 한 번씩 인사를 하는 사이로 그칠 것 같았다.
그러나, 오래 볼수록 사랑스럽다고 했던가. 오랜만에 G5 캠플러스 모듈을 꺼내서 장착해보기로 했고, 결과 새로운 기분이 들기도 했다. 마치 G5가 다시 태어난 기분이라고 할까? 추워진 날씨에 오랜만에 꺼내어 입어본 가을 옷처럼, G5 캠플러스 모듈은 색다른 신선함을 전달해줬다.
캠플러스, 플러스가 되어줘
사실 캠플러스 모듈에 대한 기대치는 G5 구매 이전에 최고조에 달했었다. 기존과는 다른 사용자 경험을 얻도록 해준다던 LG의 말을 200% 믿었었고, 심지어 DSLR의 경험까지 얻을 수 있다는 말도 2% 정도는 믿기도 했었으니까.
아무튼, 나는 바보다. 구매 이후 몇 번 조작해본 G5 캠플러스는 주변의 시선을 끌기만 했을 뿐 나의 시선을 끌지는 못했으니까. 자꾸만 손에서 미끄러지는 그립감은 안정적이기보다는 오히려 불편함을 더했고 캠플러스는 플러스가 되지를 못했었다.
사실 캠플러스 모듈에 대한 기대치는 G5 구매 이전에 최고조에 달했었다. 기존과는 다른 사용자 경험을 얻도록 해준다던 LG의 말을 200% 믿었었고, 심지어 DSLR의 경험까지 얻을 수 있다는 말도 2% 정도는 믿기도 했었으니까.
아무튼, 나는 바보다. 구매 이후 몇 번 조작해본 G5 캠플러스는 주변의 시선을 끌기만 했을 뿐 나의 시선을 끌지는 못했으니까. 자꾸만 손에서 미끄러지는 그립감은 안정적이기보다는 오히려 불편함을 더했고 캠플러스는 플러스가 되지를 못했었다.
버튼을 누르는 감도는 카메라에 있어서 ‘생명’과도 같다. 반셔터를 누른 뒤 실제 셔터를 눌렀을 때 나는 셔터음과 함께 전달되는 버튼 특유의 느낌은 사실 캠플러스에 대한 기대를 하게 만든 가장 큰 부분이기도 했었다.
그러나 결과는 싸구려 플라스틱 버튼의 느낌과 비슷했고, 결과 소프트웨어 버튼으로 사진을 찍는 경험과 비교해 아무런 차별점을 제공해주지 못 했다. 기대가 실망으로 바뀐 뒤 G5 캠플러스 모듈은 줄곧 서랍 한켠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다시 만져본 캠플러스, 느낌은?
그러나 칠전팔기라고, 다시 사용해보기로 한 G5 캠플러스 모듈은 오랜만에 만져서 그런지는 몰라도 촉감이 매우 좋았고 그립감을 높여줄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만들었다. 아, 이래서 사람들이 오래된 것이 좋다고 했던가?
아무튼, G5 캠플러스 모듈을 다시 연결하는 과정은 기대감 만큼이나 다시금 G5의 모듈 방식에 회의감이 들게 만들기도 했다. 우선, G5의 전원을 꺼야 한다. 전원 버튼을 꾸욱 누른 다음, 전원 종료를 누른 뒤 다시 확인 종료 버튼을 눌러야 하는 것.
이후 종료 화면을 몇십 초간 기다린 다음, 하단부 옆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기존의 모듈을 탈착하는 과정이 필요했고, 이것을 당겨서 꺼내야 하는 과정도 필수적이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제는 배터리와 모듈을 분리해야 한다.
상당한 힘을 줘서 ‘탈칵’ 소리와 함께 분리된 배터리를 이제 캠플러스 모듈에 다시 ‘탈칵’하며 끼워줘야 했다. 이제, 많이 왔다. 이 녀석을 다시금 G5에 꽂고는 전원 버튼을 다시금 꾸욱 눌러서 전원을 켜야 하고 다시금 기다려야 한다.
이제 잠금을 풀고, 폰이 제법 안정화가 되기까지 20초 정도를 기다린다. 이제 다 왔다. G5 캠플러스를 경험하기 위해서 캠플러스에 붙어 있는 카메라 소환 버튼을 누른다. 아, 그런데 이 버튼은 굳이 캠플러스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 볼륨 버튼을 두 번 빠르게 누르면 어디서나 카메라가 실행되기 때문.
오히려 위치상으로는 볼륨 버튼이 손에 더 가까이 다가온다. 아무튼, 셔터를 눌러본 느낌은 부들부들했고 매우 얕은 느낌이 들었다. 즉, 깊이감이 없었고 전체적으로 아쉬운 느낌이 들었던 것. 처음 만졌을 때의 느낌보다는 낫다고 생각되었지만 여전히 개선이 필요해 보였다.
줌 버튼은 여전히 적응이 안 되었는데, 슈퍼 울트라 센서티브 휠이라고 할 정도로 기름 한 통을 부은 듯 매우 빠른 줌이 되었던 것. 그런데 정작 G5 화면 속 줌은 ‘버버버ㅓㅓ벅’이고 있었다. 그래서 이 둘이 따로 논다. 아주 대판 싸운 것처럼.
동영상 촬영 버튼은 편하게 쥐고서 누르기 힘든 위치에 있었는데, 이것은 내 손가락이 짧은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아무튼, 다시 만져본 G5 캠플러스 모듈은 클래식한 맛은 있었지만 사진을 찍는 맛은 느끼기 힘들었다.
✎ 오랜만에 다시 만난 반가운 캠플러스 모듈
✎ 그러나 이 녀석을 사용하기까지는 험난한 여정이 남아 있었다.
✎ 우선은 기기의 전원을 끄는 것부터 시작했다.
✎ 그리고 옷을 갈아입듯, 배터리를 분리해야 했다.
✎ 이어서 캠플러스에 다시 배터리를 꽂아야 했다. 역시나 번거로운 모듈 교환 방식에 잠시 화가...
✎ 이제 옷을 다 입은 캠플러스, 어디서 쇼핑이라도 하고 온 듯 배가 부르다.
✎ 손에 잡히는 그립감은 역시나 기대 이상으로 좋았다. 그래도 화가 나는 아쉬움들도 여전했다.
✎ 전원을 켜고, 실 사용까지 적어도 20초는 기다려야 했기 때문.
✎ 드디어 사용이 가능해진 G5 캠플러스 모듈, 환호성이라도 외쳐야 할까?
✎ 잠시, 정신을 차리고 만져본 캠플러스, 조작 방식에 대한 점수는 40점 정도
✎ 특히나 카메라를 불러오는 버튼은 아래에 있다. 왜일까? 그냥 셔터를 꾹 눌러서 불러와도 될 것 같은데.
✎ 세로로 들고서 폰처럼 사용할 때의 불편함은 의외로 적었다. 다만 주머니에 넣으면 주툭튀(?)가 되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
✎ 이제, 다시 캠플러스와 작별할 시간이다. 안녕, 나의 캠플러스 모듈.
차기 캠플러스 모듈에 바라는 점
엘지가 G5를 위한, 혹은 G6를 위한 차기 캠플러스 모듈을 고려 중이라면 무조건 셔터 버튼의 감도를 조절해서 사진을 찍는 맛을 더해주기를 기대해본다. 그리고 휠과 실제 화면의 줌을 1:1로 매칭할 필요도 있다.
정확히 휠이 돌아간 만큼 줌이 부드럽게 이어져야 사용자 경험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기 때문. 그리고 하단에 위치한 카메라 불러오기 기능은 굳이 따로 빼지 말고, 카메라 셔터를 꾹 눌러서 실행되도록 하면 될 것 같았다. 마치 엑스페리아 X 퍼포먼스의 셔터 버튼과 같이.
그리고, 캠플러스라고 무조건 카메라에만 집중할 필요는 없다. 스피커를 강화해서 더욱 강력한 스피커 출력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자체 내장 배터리도 200%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마지막으로, G5 캠플러스는 언제나 G5에 전력을 공급하는 보조배터리가 되었으면 한다. 현재와 같이 사진 촬영 시에만 G5에 전력을 공급하는 아이디어는 너무나도 난해하고 사용자로서 불편함이 많았다.
오랜만에 서랍에서 꺼내본 G5 캠플러스 모듈, 작년에 입던 옷을 다시 만난 듯 반가운 마음도 있었지만, 역시나 다시금 기존의 모듈로 돌아가야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엘지는 차기 제품을 통해 소비자들이 진짜로 원하는 모듈을 내놓기를 기대해본다. - MACGUYV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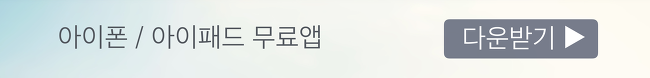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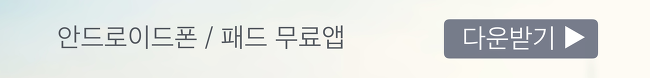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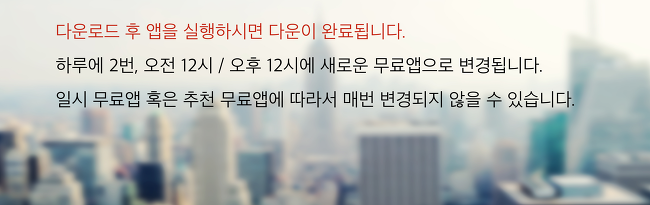















































0 개의 댓글:
댓글 쓰기